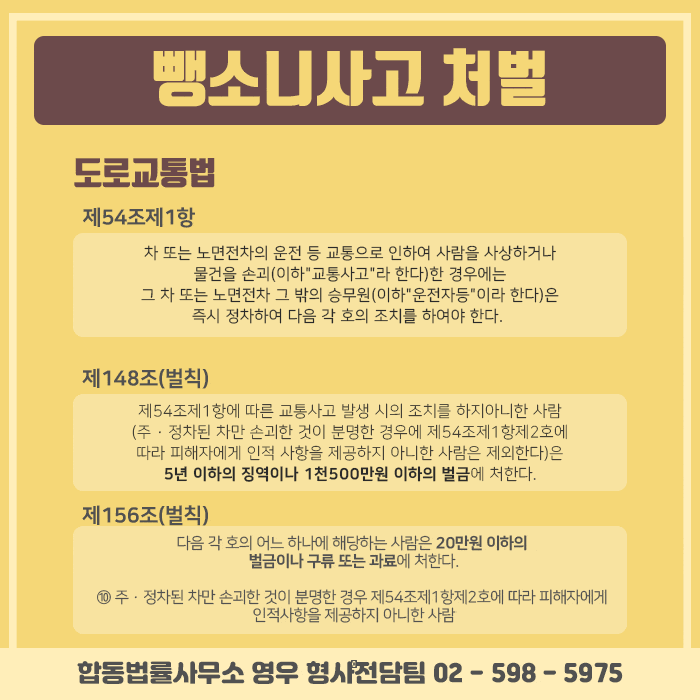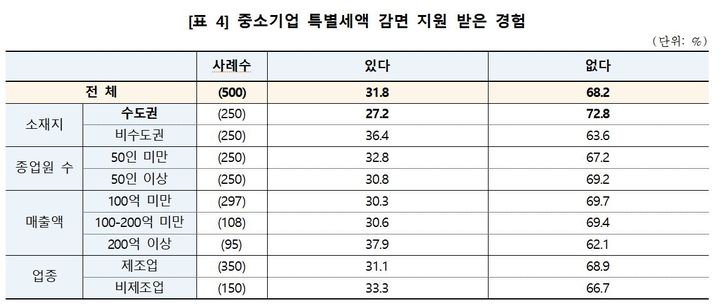여기서는 ‘취업규칙(절차위반)’과 관련된 부당해고 구제 사건과 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와 그로 인한 법적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쟁점은 “유효요건에 맞지 않는 취업규칙을 적용해 정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다. 이 사건 재판부는 입사 시 정년 요건이 없고, 인사규정에 최소 정년 유예기간인 ‘6개월’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규직 전환 컨설팅 기관과 별도의 협약은 없었다고 봤다. 개정된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주는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정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여전히 이 경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정식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도입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고, 도입조건이 유효한 조건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을 이번 사건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법정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판결 III. 요약 ① 근로자는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으로 입사하며 입사 시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음 ② 정규직화 상담기관은 정년을 최대 2년으로 차등하는 데 합의하되 연장 최소 은퇴 연령은 “6개월”입니다. 이 기한은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사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인사규정 개정은 정년의 유예기간인 “6개월”의 단기정직과 조기퇴직에 대한 사회통념이 부당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신인사규정의 개정은 불리한 변화이기는 하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요컨대 정년 관련 개정 인사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무효이며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무효한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4호) (ⓒ2020copyright. 문영섭 노동검사, 대부노동법률사무소. 02.6741.0002)